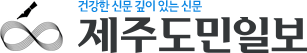[기획-무한한 가능성 지닌 제주 향토자원X ⑨]
국제적 인지도-제주 원산지 스토리 결합 산업적 가치 상승 여력
육상 발아·재배 기술 진척…안정적 원료화에 대한 기대감 커져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지난 2014년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됐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그간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인식돼 오던 생물자원은 국가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정되면서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게 될 경우 원산지국가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에 필요한 이행체계 및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원의 수입 비중이 높아 향토자원의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역시 향토자원의 활용과 바이오산업을 제주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주는 난대림과 온대림, 한대림까지 공존, 자생하는 생물자원만 해도 9787종에 이를 만큼 그야말로 보고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생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실제 식생활을 비롯해 뷰티, 의약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향토자원을 활용한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제주도민일보는 향토자원의 체계적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도, 제주테크노파크와 손을 잡고 ’제주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의 청정하고 다양한 향토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스토리]
제주의 바닷바람과 염분 가득한 갯벌에서 끈질기게 살아온 큰비쑥(Artemisia fukudo Makino)은 오랫동안 관심 밖에 머물렀지만, 최근 연구와 지역 보도를 계기로 다시 조명되고 있다. 염습지에 특화된 이 식물은 가을이면 아래로 고개 숙인 황갈색 꽃을 달고 흔들리며 ‘바닷가에서 찾은 쑥’이라는 별칭처럼 제주의 해안 풍경을 상징한다.
특히 큰비쑥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정유)과 추출물이 항염·항균 작용을 보이고, 일부 세포·시험관(in vitro) 연구에서 세포 증식 억제 신호가 보고되면서 식품·코스메틱 분야의 기능성 원료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로써 ‘버려진 갯풀’로 여겨지던 큰비쑥은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었다. 다만 이러한 생리활성은 주로 실험실 단계의 결과이므로, 사람 대상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쑥(Artemisia, 영어권의 ‘mugwort’) 자체가 글로벌 기능성 원료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로벌 네이밍 파워에 더해, 바닷가 염습지라는 독특한 자생지를 가진 ‘새로운 쑥’인 큰비쑥은 희소성과 참신성을 동시에 갖추어 브랜딩·차별화·프리미엄화에 유리하다. 다시 말해, mugwort라는 국제적 인지도와 Jeju 원산지 스토리, 해양·클린 콘셉트가 결합되면서 산업적 가치의 상승 여력이 크다.
현장 활용 측면에서는 어린순·잎을 데쳐 나물이나 전 또는 국으로 먹어온 생활사례가 전해지며 피부 진정·청결을 겨냥한 스파·화장품 응용도 시도되고 있다. 본래 해안 염습지에서만 잘 자라 대량 공급이 쉽지 않았지만, 육상 발아·재배 기술이 진척되며 안정적 원료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는 자원 보전과 산업화의 균형을 이루며 제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재정보]
큰비쑥(Artemisia fukudo Makino)은 국화과 쑥속에 속하는 한해살이 또는 두해살이풀로, 해안가 염습지에 특화된 생태를 지닌다. 한반도의 서·남해안은 물론 일본과 타이완 등 동아시아 해안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조수간만의 차가 큰 갯벌과 염분 농도가 높은 토양에서 군락을 이루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줄기는 보통 높이 30~90 cm까지 곧게 자라 기부에서부터 가지를 많이 치고, 자줏빛을 띠는 경우가 흔하며 어린 개체에서는 거미줄 같은 섬유성 털이 덮였다가 성숙하면서 점차 사라진다. 잎은 이형성을 보여, 근생엽은 개화기에 이르면 소실되고 2~3회 깊게 우상분열되며, 줄기에는 잎이 어긋나 달리는데 길이 9~12cm의 깃모양 잎이 깊게 갈라져 선형 열편을 이룬다. 줄기 상부로 올라갈수록 잎 형태는 단순해져 가늘고 선형으로 변한다.

가을(9~10월)에 줄기 윗부분에 원추화서를 형성하며, 지름 5~7mm의 황갈색 두상화가 아래로 숙수해 달린다. 소화는 통꽃만으로 이루어지며, 가장자리에 암꽃이, 가운데에 양성화가 배열되어 모두 결실 능력을 가진다. 열매는 10월에 성숙하는 난형의 수과로 길이 1.2~2mm 정도이다. 형태가 비슷한 비쑥(Artemisia scoparia)과 비교하면 큰비쑥은 두상화 지름이 5~7mm로 월등히 크고(비쑥은 1~2mm), 줄기잎의 길이 또한 대체로 2배가량 길어 현장에서 육안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형태·생태적 차이는 큰비쑥이 염분이 높은 해안 환경에 적응해 진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연구현황]
- 큰비쑥 추출물의 murine macrophage RAW 264.7 세포에서 in vitro 항염효과
윤원종 외, 한국식품과학회지, 39(4), 464-469 (2007)
- 큰비쑥(Artemisia fukudo)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
김길남 외,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6(7), 819-824 (2007)
- 큰비쑥 추출물의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김민진 외, KSBB Journal, 32(3), 233-237 (2017)
- 생육 환경 및 수확 시기에 따른 큰비쑥의 휘발성 향기성분 비교
오규연 외, Food Science and Preservation, 32(3), 565-577 (2025)
- 염생식물 및 생약초로부터 이온추출법에 의한 항노화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개발
㈜에이치씨바이오텍/중소기업청, 2010, 산학연공동기술개발, 1425064475(과제고유번호)
- 염생식물 및 생약초로부터 이온추출법에 의한 항노화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개발
㈜에이치씨바이오텍/중소기업청, 2011, 산학연협력기술개발, 1425067885(과제고유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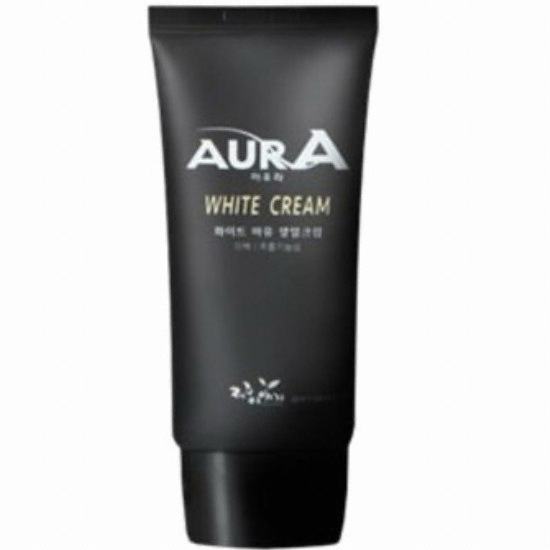
- 천연 소재 및 저분자 화합물 기반 골다공증 제어 소재기술 개발 및 실용화
(주)빅썸바이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공공연구성과활용촉진R&D, 2710036223(과제고유번호)
- LED식물공장 기반 염생식물 신소재 발굴 및 사업화
(주)진씨드/중소벤처기업부, 2025, 창업성장기술개발(R&D), 2420021011(과제고유번호)
[지적재산권]
- 큰비쑥 추출물을 포함하는 전립선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출원번호 10-2022-0012813(2022.01.28.) | 출원인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 큰비쑥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대사성 질환 개선,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출원번호 10-2023-0179281(2023.12.12.) | 출원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 큰비쑥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전립선비대증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출원번호 10-2022-0184064(2022.12.26.) | 출원인 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
- 큰비쑥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탈모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 10-2023-0084260(2023.06.29.) | 출원인 경상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
- 탈염 큰비쑥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 질환 또는 갱년기 질환 예방, 치료 또는 개선용 조성물 및 탈염 큰비쑥 추출물의 제조 방법
| 출원번호 10-2022-0115745(2022.09.14.) | 출원인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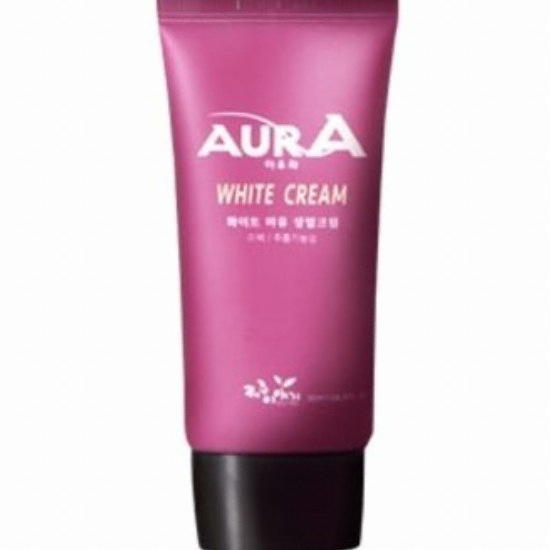
- 항염 활성과 항미생물성을 갖는 큰비쑥 정유 추출물 및 그 용도
| 출원번호 10-2009-0093932(2009.10.01.) | 출원인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 큰비쑥 추출물을 이용한 항당뇨 조성물
| 출원번호 10-2023-0012324(2023.01.31.)| 출원인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 큰비쑥 추출물을 포함하는 구강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출원번호 10-2010-0053576(2010.06.07.)| 출원인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 이 기사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원과 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